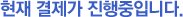Interview
Editor. Jihyun Cho, Yumi Son
Photographer. Yeseul Jun
용금옥 | 용금옥의 시대를 기리다 서울시 중구 다동길 24-2
용금옥은 1932년 중구에 문을 열었다. 지금의 자리는 용금옥이 무교로 21번지현 더익스체인지서울에서 운영하던 시절 용금옥 직원들의 숙소였다고 한다. 9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며 자리도 주인장도 바뀌었으나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들을 마주하기 위해 용금옥에 발을 디뎠다. 현재 용금옥의 주인장 신동민 씨는 90년 전 이곳의 주인장이던 홍기녀 씨의 손자다. 그는 지금도 용금옥의 옛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학교가 끝나고 여길 찾아왔어요.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려고요. 그때는 가게며 이 골목이 얼마나 북적였는지 몰라요. 지금은 재개발로 동네 여기저기가 한산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곳은 최고의 번화가였으니까요.” 그는 용금옥은 지리적 특성상 언론사 기자들과 국회의원 등 여러 화이트칼라 사람들이 즐겨 찾았으나, 추탕鰍湯은 사실 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보양식이라며 말을 이었다. “용금옥은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까지 모든 시대를 겪었어요. 모든 것이 귀하던 시절부터 자리했으니 그야말로 역사의 산증인이자 많은 이들의 든든한 한 끼였다고 할 수 있죠.” 1993년부터 이곳에서 3대째 용금옥을 이어오고 있는 신 씨는 직원들을 제치고 불 앞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찬장에서 양념을 한 숟갈 떠 추탕이 끓고 있는 솥에 넣었다. 그에게 손에 쥔 숟가락에 대해 물었다. “글쎄요. 주방에서는 이렇게 간편한 조리 도구로 쓰일 뿐 아니라 90년간 손님에게 추탕을 내는 우리 집에선 없어선 안 될 물건이죠. 더구나 추탕은 국밥이잖아요? 근데 국밥이 뭡니까? 우리 같은 서민에겐 최고의 음식이잖아요.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한국 사람이면 모를 리 없고요. 그러니 한국인에게도, 용금옥에도 없으면 큰일 날 물건이죠.”
진아춘 | 손님과 함께 세월의 봄을 맞는 곳 서울시 종로구 대명1길 18
종로 대학로길 안쪽에는 96년간 ‘진아춘’이라는 간판을 이어오고 있는 중식당이 있다. 지금의 주인장 형원호·박숙경 부부는 고모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1988년부터 진아춘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화교 2세예요. 많은 화교들이 그랬듯,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우고 일을 하며 주방 일을 익혔죠.” 형원호 씨는 처음 가족이 운영했던 진아춘이 아닌 자신만의 중식당을 준비하며 시내 호텔 중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고로 진아춘에 다시 돌아왔다고. “지금은 진아춘이 요리로 유명하지만 운영을 시작한 초·중반만 해도 식사류가 더 많이 나갔어요. 근처 서울대병원 사람들이 저희 집 단골인데 그들이 학생이었을 땐 짜장면이, 그들이 전문의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니 자연스럽게 주메뉴가 요리류로 바뀌더라고요.” 그는 손님과 함께한 시간에 따라 진아춘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 시절을 개괄했다. 진아춘의 홀과 주방에는 여러 모양새의 숟가락이 즐비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숟가락부터 양념을 치는 작은 숟가락, 등이 평평한 중식 숟가락, 메인 요리를 덜어 먹는 커다란 숟가락까지. “주방에선 양념마다 섞이지 않게 하는 용도로, 또 커다란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용도로 이만한 게 없죠.” 그러면서 중식 숟가락의 모양새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중국식 숟가락은 우리가 쓰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그러니 숟가락은 떠먹는 용도가 아니라 그릇 안 음식을 입안에 밀어 넣는 용도지요. 그래서 이렇게 밑동이 평평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아한 봄을 선사한다’는 진아춘의 이름처럼, 언제고 숱한 봄의 시간을 그곳에서 마주하길 바란다.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 | 1등이 아니어도 괜찮은 삼청동 찻집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22-1
이름부터 독특한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은 한국식 디저트라 할 수 있는 단팥죽, 쌍화탕, 식혜, 수정과 같은 후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다. 1976년 4월 이곳 삼청동 끝자락에 문을 연 서울서둘째로잘하는집은 김은숙 씨에 이어 현재는 아들 가광위 씨가 운영 중이다. 독특한 가게 이름에 대해 가 씨는 “어머니가 간판을 지을 무렵에 여기저기 원조 열풍이 불었어요. 그야말로 1등 싸움이 치열하던 시절이었죠.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1등이 뭐 그리 대수냐. 둘째, 셋째여도 상관없다. 모두 다 귀하다’는 뜻에서 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름 덕분에 손님들과도 이야기 나눌 명분이 생겼죠.” 주인장 가광위 씨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이른 아침 주방에 불을 켠다. “손으로 직접 껍질을 깐 밤과 팥을 삶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족히 두 시간은 걸리죠. 어디 이뿐인가요? 단팥죽에 고명으로 들어가는 찹쌀떡도 직접 만들어요. 저기 방앗간 기계 보이시죠?” 가 씨는 뒤쪽 주방을 가리켰다. 게다가 이곳의 명물 쌍화탕은 10가지 각종 약재를 무려 이틀간 달여 준비한다고. 그뿐 아니라 수정과 식혜, 대추생강차 등 모든 메뉴에 시간과 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님상에는 이 모든 음식에 숟가락이 함께 오르고 있었다. “우리 집 숟가락은 떠먹는 용도가 주는 아니에요. 뜨거운 죽이나 음료를 식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침전물을 다시 섞는 용도지요. 그래서 사기로 만든 수저가 여러모로 안성맞춤이긴 한데, 회전율이 높아 보관하기에 무겁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에게 숟가락 관리에 대해 물었다. “모든 집이 그러겠지만 영업이 끝나면 뜨거운 물에 삶아요. 팔팔 끓는 물에 소독 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쓰고, 닦고, 삶으면 숟가락이 점차 마모가 돼요. 그럴 땐 또 새로운 숟가락을 준비하는 거죠. 별수 있나요?” 지난 45년간 몇 개의 숟가락이 이 집을 거쳐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비품이 바뀌고 낡아 변해도 손님상에 오르는 음식에 대한 주인장의 정성과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가업을 잇고자 하는 의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치 않을 거라 점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