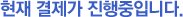도시락을
Interview
Editor. Jihyun Cho
Photographer. More Choe
대학 시절에 아현동에서 함께 살았다고 들었다. 어떻게 가까워지고, 같이 살게 됐나?
이슬아(이하 이)‣ 열아홉 살 때 ‘고정희 청소년 문학상’ 대회로 향하는 관광버스에서 처음 만났다. 무려 해남 땅끝마을에서 열렸다.
안담(이하 안)‣ 문학상에서 만나 ‘하자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함께 들으며 가장 친한 라이벌로 지내왔다. 라이벌치고 너무 붙어 다녔다. 슬아 집에서 자기도 하고, 슬아가 내 기숙사로 놀러 오기도 했다. 둘이 놀아도 놀아도 안 질리길래 같이 살면 어떨까 싶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걸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슬아만은 괜찮을 것 같았다. 그건 실제로 맞는 말이었다. 둘이 같이 사는데도 혼자 살고 싶어진다면 다른 사람하고는 더더욱 못 사는 거고, 정말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룸메이트였다고 생각한다.
이‣ 둘 다 서울에 집이 없는 가난한 스무 살이었다는 점도 결정적 이유였다.(웃음)
안‣ 슬아는 대학교가 온수에, 나는 신림에 있었다. 함께 살던 아현동은 어느 쪽과도 가깝지 않았기에 둘 다 딱히 억울할 건 없었다.
완벽한 룸메이트였다니,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서로의 방식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이‣ 담이는 자신만의 공고한 세계가 있지만 깍쟁이 같은 구석이 없었다. 물건을 빌려 써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안‣ 내가 정한 규칙은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 규칙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에 의해 내 물건을 쓴다면 정리는 나중에 내가 하면 된다. 사실 서로 터치하지 않기에는 집이 너무 좁았다.(웃음) 슬아가 큰 방을 쓰고, 나는 작은 방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 슬아 방이 자연스럽게 거실 역할을 하게 됐다. 옷방이기도 하던 그 방에서 같이 외출 준비를 할 때면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괜히 옷을 맞춰 입었다. 그럼 아현역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각자의 대학교로 향하는 거다.(웃음) 죽이 잘 맞았던 것 같다.




각자의 대학교로 향하기 전, 담 작가님은 슬아 작가님에게 종종 도시락을 싸줬다.
담 작가님이 슬아 작가님에게 쓴 편지 중 이런 문장이 있다.
“아침이 오면 우리는 엊저녁에 만든 강된장, 청포묵 무침, 티라미수가 든
락앤락을 각자의 가방에 넣고 하나는 신림으로, 하나는 온수로 가지.”
바쁜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는 행위 자체가 정성으로 다가온다.
안‣ 도시락 싸주는 걸 좋아했다. 아마 혼자 살았다면 안 했을 거다. 근데 슬아는 일단 밥을 정말 맛있게 먹고, 내가 무얼 하든 좋아해줬다. 또 끼니를 밖에서 다 해결하기엔 너무 가난했는데, 돈이 없다고 대충 살고 싶지는 않았다. 매일 똑같은 메뉴의 도시락만 먹으면 질릴 테니 같은 강된장을 담더라도 하루는 같이 비벼 먹을 반숙 달걀을 옆에 놓고, 하루는 찐 호박잎에 밥과 강된장을 넣고 돌돌 말아서 쌈밥처럼 만들기도 하는 변주를 줬다. 그래야 도시락 열 때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았다. 도시락 레시피를 많이 찾아보다 보니 나만의 메뉴도 생겼다.
이‣ 그 도시락을 캠퍼스에 가서 점심 때 꺼내 먹는 거다. 혼자 밥을 먹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 가끔은 카드나 편지도 들어 있었다.(웃음)
안‣ 나 지금 기억났어. 맞다. 내가 편지도 써서 넣었네.
함께 살 때의 식탁과 지금 식탁의 다른 점이 있다면?
안‣ 때는 일단 지금보다 손이 느렸고, 메인 요리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기 요리를 자주 했다. 지금도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메뉴를 만드는 습관은 남아 있지만, 채소로 만들어야 하니 상상력을 더 발휘하게 됐다. 물건으로서의 식탁을 떠올려보자면, 어디서 주워 온 2인용 식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쓴 기억이 난다. 지금은 둘 다 멋지고 큰 나무 식탁을 사용하고 있다.
이‣ 힘든 날에 특히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 게 기억 난다. 할아버지께서 언제나 몸보신은 고기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힘든 날일수록 남의 살을 먹자’ 같은 말을 자주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아담한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파는 시장 닭강정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사실 고기를 먹는 게 더 간편하고 저렴하지 않나. 지금은 앞집에 사는 엄마와 부엌을 공유하니까 비건으로 3~4인이 먹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자취하는 두 여자애가 비건으로 저렴하게 먹는 것을 몸에 익히기에는 연륜도, 돈도,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툴즈> 2호의 주제는 ‘숟가락’이다. 두 분에게 숟가락은 어떤 의미인가?
안‣ 다른 사람 앞에 놓아줄 때 특별히 기분 좋은 물건.
이‣ 정말 좋아하는 충청도 말이 있다.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은 잘 있어유?”라고 물어보는데, 죽었을 경우엔 “숟가락 놨슈… ”라고 한다고 한다. 살아 있다는 것은 숟가락을 드는 것이다.